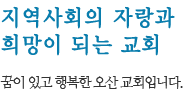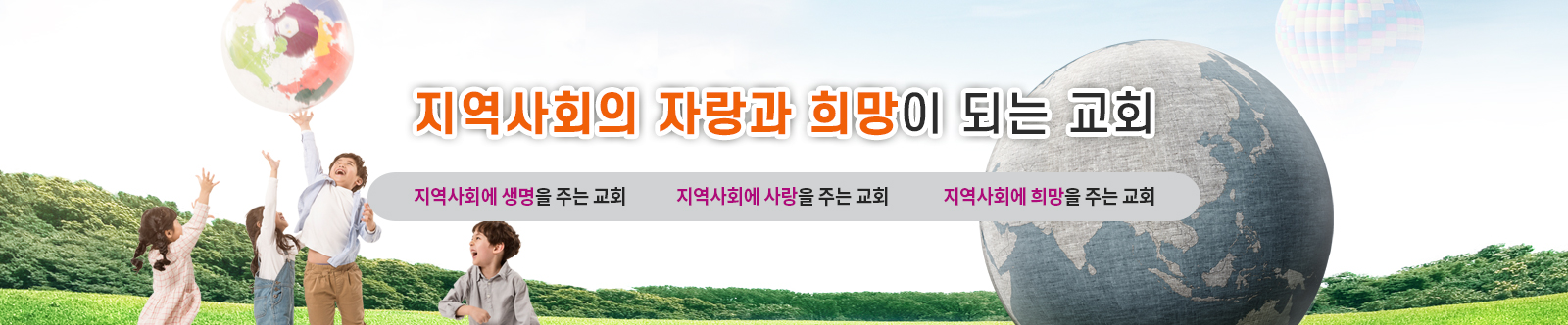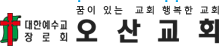왜 몽고간장이 유명할까요?
페이지 정보

본문
?
안현숙 집사님이 간장 샘플을 들고 오셨습니다.
어릴때부터 간장을 왜간장, 몽고간장등으로 부르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고 지내던중 45년이나 된 지금에 갑자기 궁금해져서 인터넷 강국에 살다보니 검색해 보았습니다. 마침 몽골에 선교사로 가계신 분이 올려놓은 글이 있길래 퍼왔습니다.
?
?
몽골과 몽고간장
몽골교민신문뉴스 kmnews.co.kr/생활이야기 2008/12/01 23:22
초원을 달린다 나의 몽골 이야기 - 3
?
간혹 한국에서 몽골에 관하여 설교나 강의를 하면서 서두에 몽골을 소개할 때 나는 몽고간장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좋아한다.
1990년 3월에 한국과 몽골이 정식 국교를 수립하기 전에 우리는 몽골을 외몽고(外蒙古)라고 불렀다. 몽골(mongolia)의 어원은 영원한 불이란 뜻의“뭉흐갈” 또는 “몽강”에서 왔다고 하는데 “용감한 민족”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런데 중화사상(中華思想)에 도취된 중국 사람들이 주변의 각 나라와 민족들을 낮추어 보고 멸시하는 뜻으로 동이(東夷동쪽 오랑캐, 우리 한민족), 서융(西戎 서쪽 원숭이), 남만(南蠻 남쪽 야만족), 북적(北狄 북쪽 오랑캐) 하듯이 몽골을 ‘옛날부터 무지 몽매한 오랑캐’란 뜻으로 몽고(어두울 夢 옛 古)라고 불러왔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
1917년에 몽골이 입헌 군주국으로 독립을 선포하며 중국 청나라 왕조의 속국에서 벗어날 때 당시 몽골 영토의 약 1/3정도는 중국에 남겨져 현재의 중국 내몽고 자치주가 되었는데 이곳을 중국 내에 있다 하여 내몽고(內蒙古)라 하고 독립된 몽골국을 외몽고(外蒙古)라 불렀다. 우리나라도 중국 한자 표기를 따라 몽고 또는 외몽고라 부르다가 1990년 국교가 수립되고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몽골’이란 정식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다.
어쨌던 몽골이 곧 몽고인데 내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 특히 부산 경남 사람들에게는 오래 전 일제시대 때부터 경남 마산에서 생산되어 한강 이남의 중국집과 식당, 나중에는 가정 집 부엌에까지 널리 자리 잡은 ‘물 좋은 마산의 몽고간장’ 때문에 몽고란 단어가 상당히 친숙한가 보다. 그런데 몽골에는 ‘몽고간장’이 없다.
한번은 선교지 방문차 몽골에 온 어떤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선교사님, 몽골에 와서 보니 간장 된장은 고사하고 소금 외에는 아무런 양념을 구경할 수 없는데 한국에서는 왜 몽고간장이 유명합니까?”라고 물었다.
실제로 몽골족은 유목민의 후손이요 지금도 국민의 상당수가 떠돌이 유목을 하는 사람들로서 양고기를 주식으로 하는데 양념을 사용하는 음식문화나 요리기술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아침은 간단한 우유차(쑤테차: 끓인 물에 우유와 찻잎, 소금을 넣은 것) 한잔과 딱딱한 말린 치즈(뱌슬락)한 조각으로 때우고 점심과 저녁은 소금을 넣어 끓인 양고기 국이나 양고기 기름으로 볶은 손 칼국수를 주로 먹는다.
귀한 손님이 오면 대접하는 몽골의 대표적 전통요리는 ‘호르호끄’라는 것인데 갓잡은 양고기를 뼈에 살덩이가 붙은 채 어른 주먹 두개만한 크리로 토막 내어 40리터(두말)들이 알루미늄 압력 찜통에 넣고 쪄낸 것이다.
한쪽에서 남자 어른이 양을 잡아 토막 내는 일을 할 때 여자와 아이들은 마른 쇠똥 또는 장작으로 불을 피우고 주먹만한 조약돌들을 불에 달군다. 고기가 준비되고 돌이 충분히 달구어지면 찜통 속에 고기토막과 뜨거운 조약돌을 차례로 한 켜 한 켜 채워 넣는다. 그리고 소금을 넣어 간을 맞추고 뚜껑을 닿아 밀봉한 후 통째로 다시 불 위에 올려놓으면 안에 있는 뜨거운 돌과 바깥 불의 열기로 고기가 골고루 잘 익혀진다. 충분히 익힌후 뚜껑을 열면 먼저 뜨거운 돌멩이를 꺼내어 손바닥에 놓고 이 손 저 손으로 옮겨 가며 손바닥을 덥힌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위장을 따뜻하게 하여 소화가 잘되게 한다고 하니 우리네 한방에서 장심에 뜸을 뜨는 것과 같은 원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기름기와 수분은 찜통 바닥에 고여 맛있는 양고기 육수가 되고 윗부분의 기름기 빠진 고기 토막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한 토막씩 손에 들고 각자가 가진 날카로운 손칼로 하얀 뼈만 남을 때 까지 잘게 잘라 먹는 것이다. 이때 한국 사람들은 준비해간 고추장을 발라 먹는 것을 종종 본다. 이 외에 우리나라의 설날과 거의 같은 의미인 차강사르 명절에 집집마다 2,000개 정도씩 양고기 살코기를 넣고 빚어 만드는 찐 만두 같은 ‘보우츠’가 있고 어른 손바닥 크기의 양고기 튀김만두 격인 ‘호쇼르’ 정도가 몽골의 전통 요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몽골 음식에는 소금 이외의 양념이 별로 없다.
?
그렇다면 몽고간장은 도대체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
경남 마산시 추산동에 가면 3.15 의거 기념탑 맞은편 철길 굴다리 옆에 4각 기와지붕에 단청을 곱게 칠한 정자 같은 조그마한 한옥 건물이 잇다.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정자가 아니라 지붕 아래에 나무판자로 뚜껑을 만들어 덮은 커다란 우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안내문에는 이 우물의 이름이 몽고정(蒙古井)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주후 1250년 경에 몽골군이 고려를 정복하고 일본마저 치기 위하여 부산과 경남 일대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산시 추산동에 정동행성(征東行城)을 설치하고 주둔하던 몽골 군대의 식수를 위하여 이 우물을 팠다고 한다.
지금은 우물에 뚜껑을 덮고 자물쇠를 채워 두었으므로 확인할 수 없으나 몇 년 전까지만 하여도 이 우물에는 맑고 깨끗한 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내가 마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 몽고정 바로 옆에 있던 친척 아저씨 댁에 하숙을 하였는데 가끔 수돗물이 안 나올 때에는 우물물을 길어다 세수도하고 마시기도 하였다. 아침마다 학교에 갈 때 우물 옆을 지나가면 꽃 파는 아저씨가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리어카 위에 가득 실린 국화와 장미 다발에 뿌려주는 것을 보곤 하였다.
바로 그 옆으로 일제시대 때부터 간장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이 몽고정 우물물로 간장을 만들었다 하여서 ‘몽고간장’이라 불렀다. 지금은 간장 공장은 가까이에 있는 창원공단 내의 차룡단지로 옮겨가고 원래의 공장건물은 본사 사무실 겸 상품전시관으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몽고간장 회사의 창업주는 돌아가시고 지금은 그 아들 강 만식 씨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1991년 몽골에 간장과 된장 등을 한 컨테이너 기증 하였으나 몽골 사람들이 먹지를 않아서 싼 값에 시장에 내다파는 것을 우리 한국 선교사들과 유학생들이 사다가 오랫동안 맛있게 먹은 적이 있다.
친구들이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몽고정 이야기를 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안목사가 몽고정 우물물 마신 것 때문에 몽골 선교사로 보내신 게 아닌가?’하고 놀린다. 그렇다면 알고 먹었건 모르고 먹었건 간에 몽고간장을 먹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몽골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 몽골교민신문 2007년 10월 19일
1992년 8월 몽골 선교사로 입국하여 게렐테이레두이교회, 바양호쇼교회, 아마갈릉교회 등을? 설립하여 선교 사역을 하고 있으며, 울란바타르 YMCA 설립, 몽골 국립사범대학교, 울란바타르대학교, 몽골연합성경학교(UBTC) 교수, 몽골축구협회 국제관계 고문 등을 역임하고 현재 국제기아대책기구 몽골지부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
본지에서는 안경갑 목사의 초기 10년 간 몽골생활 이야기를 중심으로 몽골 초기 교민사회의 진솔한 삶을 조명하여 연재하고 있다.
- 이전글성가 감상 09.03.01
- 다음글초등부 아이들의 시편 23편 주제 꾸미기 09.03.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